[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행복의 길을 묻다] 육체적 선(善)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재물, 명예, 권력을 모두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신체의 건강보다 나은 재산은 없다’(집회 30,16)고 말한다. 또한 동양에서는 ‘5복’ 안에 건강과 치아가 모두 들어있을 정도이다. 더욱이 현대의 젊은이들은 ‘프로필 사진 촬영, 식스팩 만들기’ 등 남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자신의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 아직 젊은이들은 건강 자체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매우 절실한 생존의 문제가 된다. 성경의 대표적 의인 욥도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었을 때보다 온 몸에 ‘고약한 부스럼’이 덮쳤을 때 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묘사된다.(욥 2,1-10 참조) 그렇다면 건강이나 쾌락과 같은 육체적 선이야말로 최종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닐까?

육체의 선을 넘어서는 인간의 최종 목적
성 토마스에 따르면, 행복에 있어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을 능가해야 한다.(I-II,2,5) 그러나 육체의 선만이 행복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많은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하다. 인간은 결코 사자의 용맹함이나 코끼리의 힘, 치타의 빠름을 능가할 수 없다. 영광스러운 ‘올림픽 금메달’조차 나약한 인간들끼리 경쟁해서 얻은 성과일 뿐이다.
더 나아가 육체적인 선에만 인간의 행복이 있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성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보다 높은 목적을 향해 살아가며 인간 자체가 최고선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생명 유지, 즉 인간 육체의 보존일 수는 없다. 성 토마스가 존경하던 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는 이미 “살아있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보다 좋고, 인식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보다 좋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강보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더 높은 목적이 있다.
더욱이 성 토마스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에게서 육체의 존재가 영혼에 의존할지라도 인간 영혼의 존재는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육체 자체는 영혼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평생에 걸쳐 돈을 모은 부자들조차 중병에 걸리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한다. 여기서 재물과 같은 외적 선들은 건강과 같은 육체의 선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성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 자체는 ‘지나가 버리는’ 본성을 지닌다.
“삶 자체는 지나가 버리고 […]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명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 안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으로 치닫기 때문이다.”(I-II,5,3)
이렇게 육체적 삶의 유한성은 장수와 건강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채우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육체적 쾌락을 능가하는 완전한 쾌락에 대한 성찰
그렇지만 육체의 선에는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을 즐겁게 해 주는 ‘쾌락’이 존재한다. 이러한 즐거움이야말로 최종 목적이 아닐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극대화하는 삶은 짐승들에 알맞은 삶이며, 욕망의 노예가 될 뿐인 삶이라고 말한다. 또한 쾌락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단기적이어서 궁극적이거나 자족적일 수 없다.
그러나 쾌락을 이렇게 간단히 행복의 후보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쾌락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진 에피쿠로스이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무엇보다도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행복은 즐거움 즉 쾌락이다. 모든 동물의 행동과 삶은 이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고통을 피하는 것 혹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쾌락을 욕구하고 그것을 최고선으로 즐긴다. 반면에 고통은 최고의 악으로 혐오하고 이를 가능한 한 피한다.”(키케로, 「최고선악론」)
그런데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주장들을 통해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가 누명을 쓰게 된 데에는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영향도 매우 컸다. 그런데 그들의 오해와 달리 그가 생각했던 진정한 쾌락이란 결코 육체적 방탕이 아니었다.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정념에 사로잡힌 극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태에서 찾았다. 따라서 쾌락은 그에게 ‘영혼의 혼란으로부터의 해방’, 즉 ‘정념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정의된다. 이런 상태를 에피쿠로스는 ‘영혼의 평온’(Ataraxia)이라 불렀다.
성 토마스는 육체적 쾌락을 인간이 누리는 대표적인 즐거움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에피쿠로스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물론 그는 육체적 즐거움이야말로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삼켜버려 다른 모든 선을 경멸하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쾌락이 곧 ‘최종 목적’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은 행복을 따라오거나 행복의 어떤 부분을 따라오는 하나의 고유한 우유(偶有)”, 즉 행복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I-II,2,6) 더욱이 그는 즐거움은 선(善) 때문에 욕구될 만한 것이며, 이런 경우 선은 즐거움의 근원이며 그것에 형상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토마스는 만일에 인간이 자기에게 적합한 어떤 ‘완전한 선’을, 실제로 혹은 희망으로 혹은 적어도 기억 안에 가짐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복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불완전한 선’이라면, 그 쾌락이란 진정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한 부분만을 가진 것(分有)이나 행복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성 토마스에 따르면, 완전한 선을 따라오는 즐거움 그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복의 본질이 아니고 우유로서 행복의 본질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토마스가 말하는 완전한 쾌락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선, 또는 정신적인 선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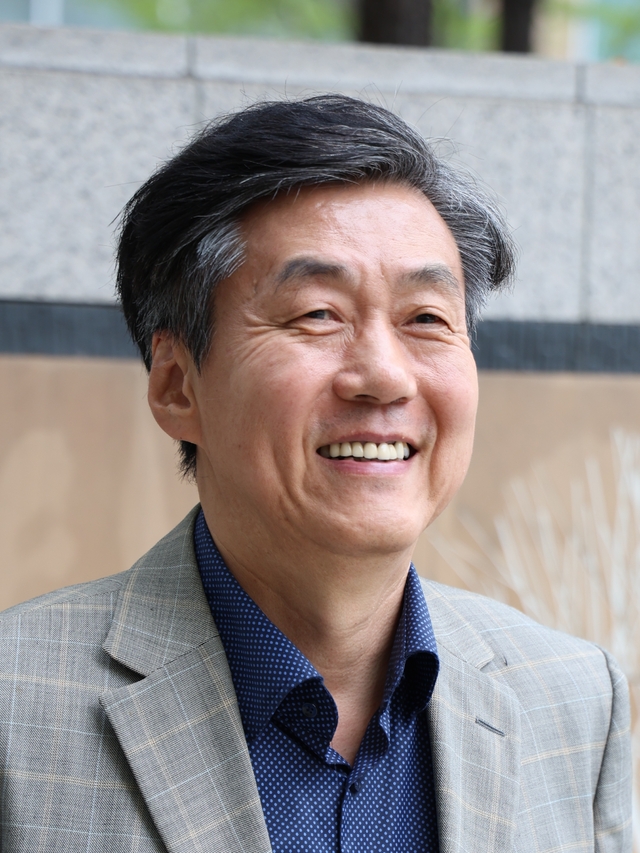
글 _ 박승찬 엘리야 교수(가톨릭대학교 철학과)
